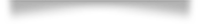제목
―독자가 가장 먼저 읽는 글
일어날 ‘기起’, ‘두루 주周’. ‘두루두루 일어나라’는 뜻에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할아버지는 몸이 쇠약해져 병원에 입원해서도 좀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새근새근하는 숨소리를 내며 종일 누워만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채 잠이 든 사람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겨우 입을 열어 “손…”이란 말씀을 남기고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이는 무심결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입술이 벌어지는 틈을 타 간신히 빠져나온 단어처럼 느껴졌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헤매는 동안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마지막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으리라. 다만 “이리 오렴, 기주야” 하고 발음할 기력이 부족했던 탓에 “손…”이라고 속삭이듯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그저 이름의 주인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행위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외치는 간절한 절규와 다름없다.
이름은 숭고하다. 숭고하지 않은 이름은 없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르는 일만큼 이나 이름을 짓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어쩌면 사람이 이름뿐 아니라 글의 이름인 제목을 구상할 때도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모른다. 한 자 한 자 진심과 눈물을 잉크 삼아 써 내려간 글이 독자의 마음에 가닿길 바란다면 말이다.
제목은 ‘작품이나 강연에서 그것을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적절한 설명 같지만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는다.
제목, 하면 나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떠올리곤 한다. 건물에 들어가려면 문에 닿린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돌려서 출입문을 열어젖혀야 한다. 건물과 사람 간에 이뤄지는 최초의 물리적 접촉은 손잡이에서 일어난다. 손잡이는 건물과 사람을 연결한다.
재목의 역할도 비슷하다. 독자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목과 마주한다. 표지에 박혀 있는 제목을 곱씹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유추하고 주제와 흐름을 짐작한다. 어떤 독자는 제목만 보고 페이지를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제목은 독자가 가장 먼저 읽는 글이다.
미국의 출판인 앙드레 버나드는 “제목은 책의 눈동자”라고 했다. 제목을 정하는 일이야말로 글쓰기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한 편의 글이 용의 몸통이라면 제목은 용의 눈이다. 몸통을 아무리 잘 그려도 눈을 그려 넣지 않으면 죽은 그림이 되고 만다.
제목은 책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 당연히 출판사는 책의 가치를 높일 제목을 찾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한때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미국에서 《정의justis》라는 다소 밋밋한 제목으로 출간됐으나 국내 출판사가 책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의문형 제목으로 다듬은 것이다.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수족관에서 범고래가 점프하는 모습을 보다가 떠올린 의문에 답을 찾고자 쓰기 시작한 책으로, 원제는 《고래야 잘했다Whale done》이다. 원제만 놓고 보면, 자칫 범고래 훈련법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음직하다.
책의 제목에 얽힌 사연은 차고 넘친다. 제인 오스틴이 애초에 ‘첫인상’이라는 이름으로 탁고한 소설은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유명한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갈아입었다.
김훈 작가의 소설 《칼의 노래》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마터면 ‘광화문 그 사내’로 출간될 뻔했다는 후문이다.
장 폴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문학의 언어를 ‘사물의 언어’와 ‘도구의 언어’로 나눴다.
전자는 작가의 내면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태어나는 투명하고 순수한 언어이다. 시의 언어가 대표적이다. 후자는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독자 앞에 드러내기 위해 언어를 도구로 삼는 경우다. 산문의 언어가 여기에 속한다.
그럼 제목은 도구의 언어인가? 아니면 사물의 언어인가? 질문을 다듬어서 다시 던져보자. 좋은 제목은 두 요소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가“
글쎄다. 글의 목적과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쏠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본문에 활기를 불어넣는 제목을 ‘활제活題’로 명명할 수 잇을 텐데, 이런 제목은 대개 도구의 언어와 사물의 언어가 절묘하게 포개지는 지점에서 솟아나곤 한다.
서점을 배회하다 보면 기발한 제목으로 독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책이 종종 눈에 뛴다. 운이 좋으면 책의 저자와 편집자를 직접 만나 제목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다.
이때 농담 삼아, 아니 진담일 수도 있는데, “좋은 제목요? 당연히 많이 팔리는 책의 제목이 좋은 제목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라는 식으로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진중하게 들려준다.
“표지라는 바다에서 제목이 목적성을 잃고 표류해선 안 됩니다. 제목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책이 제시하는 방향이 잘 내포되어야 해요. 다만 그런 제목은 억지스러운 조어造語에 매달릴 땐 잘 떠오르지 않더군요. 뭔가에 홀린 듯이 덜컥 움켜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 ‘어느 날 시가 내게로 왔다’는 문장처럼 말이죠.
신문사 편집부에 근무하던 시절, 네루다의 이 문장을 내 방식으로 바꿔 ‘어느 날 좋은 제목이 내게도 오겠지…’라고 굳게 믿으면서 종일 제목과 씨름하며 지낸 적이 있다.
독자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제목을 구상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업무를 익히느라 애를 많이 먹었고 또 욕도 많이 먹었다.
편집은 창조라기보다 재창조 혹은 재구성에 가깝다. 편집 과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섞고 배열해서 새로운 구조와 결론을 끌어내는 일이다. 편집 기자의 일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제목假題目이 달린 원고가 사내 데이터베이스DB에 올라오면 이를 꼼꼼히 읽고 기사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 제목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지면에 배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배 편집 기자는 후배 기자를 향해 “잘 뽑아야 해”, “제목은 큰 글씨로 뽑는 기사라는 걸 명심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사 ‘뽑다’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한다.
실제로 편집 기자들은 전체 내용에서 핵심 글귀를 추출抽出하듯 제목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다. 제목의 기본 역할은 본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입에 착착 감기는 제목을 뽑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미명 아래 ‘절름발이 행정’, ‘외눈박이 행태’, ‘귀머거리 정책’ 같은 표현을 글 앞부분에 박아 넣는 건 문장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지름길이다. 이런 제목에는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신체의 소유자’라는 그릇된 가정이 깔렸다. 조악한 발상이다.
제목에 너무 많은 정보를 욱여넣어서 독자가 본문을 상상할 기회를 아예 박탈하거나, 너무 두루뭉슬한 제목을 내세워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또한 활제의 반대인 사제死題에 해당한다. 글을 죽이는 제목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며 “광이불요 光而不燿”라는 글을 남겼다. 빛나되 번쩍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처세處世에 대한 조언으로 읽히지만, 내겐 제목이 지녀야 하는 요건에 관한 이야기로 다가온다.
제목은 너무 번쩍거릴 정도로 빛을 뿜지 않아야 한다. 적당히 빛을 비춰 독자가 책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을 충분하다.
―이기주, 『글의 품격』, 황소북스, 2019. (박수호 시창작에서 공유함)